Conceptor’s Screenshot
드라마 같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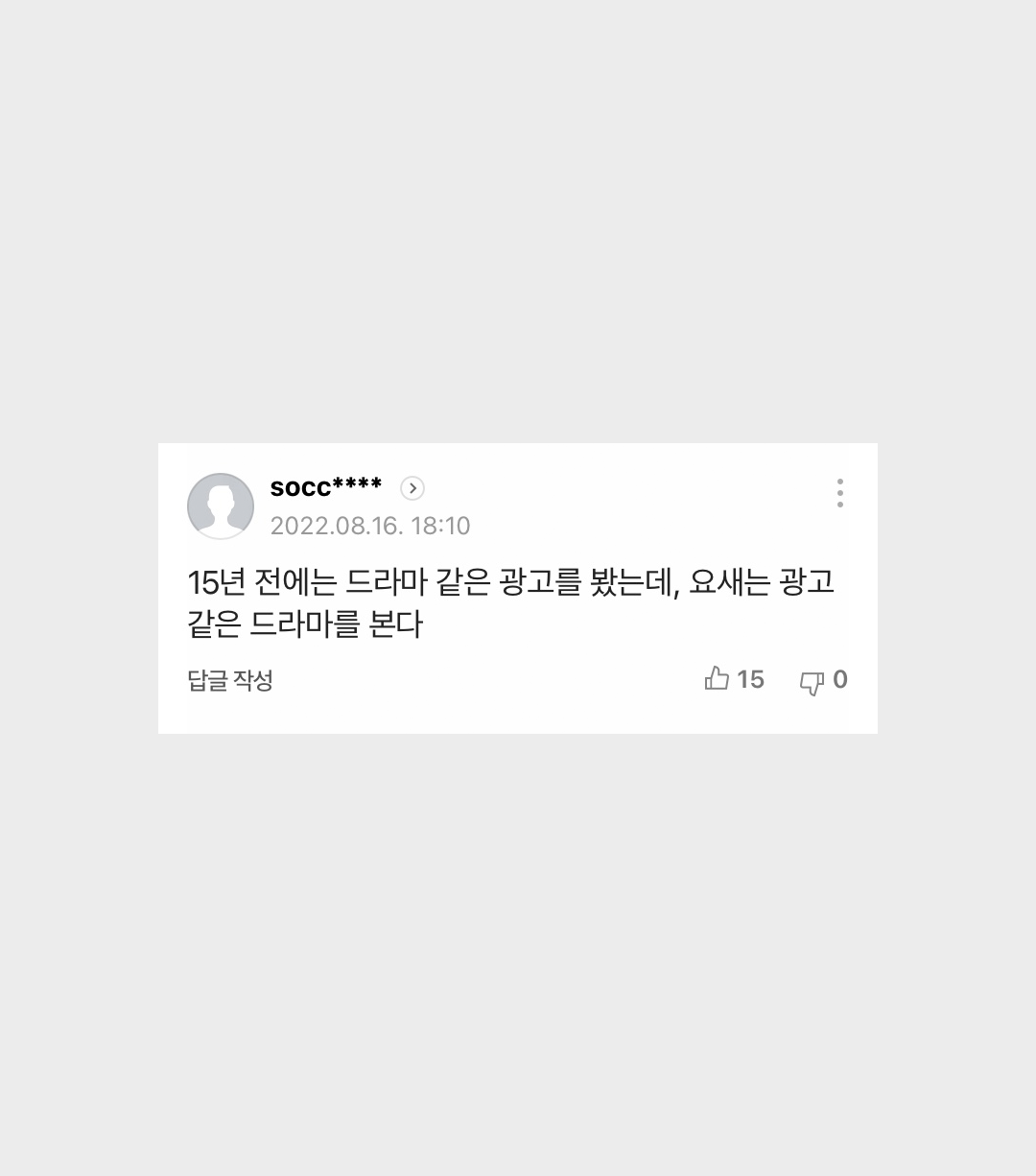
요즘의 광고 기획들이 내용은 더욱 가벼워지고 일시적인 자극만을 쫓는다며 한탄할 일은 아닐듯하다. 예전에는 TV 매체 하나만으로도 메시지 확산이 가능했고 실제로 우리가 ‘앉아서 영화관 관객처럼’ 광고를 접하는 일상적 시간이 많았다. 나름대로 기다림을 반강제하는 전달 상황에서 강력한 서사로 무장한 광고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을 것. TBWA가 00년대 성취한 영화 같은 광고들은 탁월한 광고인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영화관 관객처럼 광고를 바라볼 시간과 태도를 가진 다수의 시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본다. 광고음악이 상위권 차트에 오를 수 있는 것도 - 음악은 언제나 시간적인 수용력을 전제로 하기에 - 이러한 관객들이 들어줄 상황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는 00년대에 독특하게 형성된 맥락은 아니고, TV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역사가 차근히 쌓아올린 필연적 결과물일 것. 물론 지금의 매체 수용자는 TV 앞 관객들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파편화된 플랫폼들 속 주체들로 변종되어 있다. 관객의 시간은 15초에서 5초로 단축되었고, 매월 돈을 지불하기만하면 광고 없이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외견상 광고로부터 자율권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더욱 기만적이고 가혹해졌다. 다양한 플랫폼 공론장에서 펼쳐지는 은밀한 바이럴들이 영화 같은 내러티브를 대체하고 있으며, 가열찬 폭로와 교묘한 기만 서사를 쏟아낸다.
그러나 이런 변화상을 스샷의 댓글처럼 이상화된 과거와 그렇지 못한 현재라는 이분법적 감상으로 갈무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광고가 통용되는 상황이 바뀐 것에 따른 적응력인 것이지 현재가 과거보다 구리다라며 윤리적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현 수용자들은 더는 영화 같은 광고에 열광하지 않는다. 즉 브랜드가 꾸며낸 울림의 이야기가 아닌 진짜 그 브랜드가 활동하고 만들어내는 현실의 서사가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환경이 교묘해진만큼 우리들도 더 예리해진 것. 물론 브랜드나 기업들도 진정성의 서사를 현실에 존재하는 것마냥 교묘히 포장하는 역량도 그만큼 늘어난 것도 사실,,,그리고 브랜딩 역할론이 광고 마케팅 영역보다 더 ‘근본적’이라 회자되는 것도 진정성 포장술이 브랜드 활동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인것 같기도.
한마디로 영화 같은 광고를 영화 같은 브랜딩 서사가 대체하고 있는게 아닐까. ●
